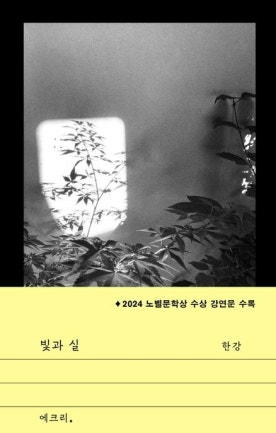
문학 앞에 선 한 인간의 정직한 고백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강연집 『빛과 실』은 손바닥만 한 작은 책이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책을 읽는 내내 저는 한 작가가 단어 하나를 고르기 위해 얼마나 깊은 밤을 보냈을지, 타인의 고통을 글로 옮기는 일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또 간절히 원했을지 생각하며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이것은 화려한 수상 소감이 아니라, 한 인간이 문학 앞에서 스스로에게 던졌던 가장 정직하고 치열한 질문들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딱딱한 분석 대신, 한 명의 독자로서 제가 받은 깊은 감동과 생각들을 나누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빛’과 ‘실’, 어둠 속에서 길어 올린 희망의 언어
책의 제목인 ‘빛과 실’은 이 책 전체를, 나아가 한강 작가의 문학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아름다운 열쇠가 되어주었습니다.
금실, 마음과 마음을 잇는다는 것
‘실’이라는 이미지는 작가가 여덟 살에 썼다는 시 한 편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이란 무얼까? /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실이지.” 어린아이의 이 순수한 통찰이 훗날 작가의 문학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녀에게 글쓰기는 단절된 존재들을 잇는 유일하고도 절실한 ‘실’을 잣는 행위입니다.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을 꿰매고, 폭력으로 찢긴 상처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는 일. 그녀의 소설 속 인물들이 끝내 작별하지 않고 애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연결’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빛, 가장 어두운 곳에서 발견한 생명의 증거
‘실’이 연결의 방법이라면, ‘빛’은 그 여정이 향하는 곳을 보여주는 희미하지만 따뜻한 불빛 같았습니다. 작가는 학살 희생자들의 묘지에서 눈을 감았을 때, 눈꺼풀 안으로 스며들던 주황빛 태양을 ‘생명의 빛’으로 기억합니다. 나뭇잎을 통과한 투명한 연둣빛에서 근원적인 기쁨을 느끼기도 하죠. 그녀의 문학이 그토록 처절한 고통을 다루면서도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이처럼 작은 빛의 조각들을 결코 놓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빛이 언제나 따뜻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북향 방’에서 인공조명에 익숙해져 가는 사람의 이야기는, 어쩌면 진실한 경험과 기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서늘해졌습니다. 한강의 ‘빛’은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작가의 짐: “내가 이 고통을 써도 되는가?”
이 책에서 가장 제 마음을 울렸던 질문은 “과연 내가 이 고통을 써도 되는가?”라는 작가의 고뇌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창작자가, 어쩌면 타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품어봤을 윤리적 질문일 겁니다.
한강 작가는 해답을 찾는 대신 “질문들을 견디며 그 안에 산다”고 말합니다. 이는 글쓰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오만한 태도가 아니라, 고통 곁에 끝까지 머무르려는 겸허한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타인의 고통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빼앗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투명한 통로가 되기를 자처합니다. 『소년이 온다』를 쓴 뒤 겪었던 극심한 몸의 고통에 대한 고백은, 그녀에게 글쓰기가 머리로 하는 일이 아니라 온몸으로 죽은 자들의 아픔을 함께 겪어내는 일임을 보여주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언어가 부서지는 고통의 극한에서, 그녀는 ‘몸’을 최후의 기록으로 삼습니다. 폭력에 저항하며 식물이 되어가던 『채식주의자』의 영혜처럼, 그녀의 인물들은 온몸으로 자신의 고통과 저항을 증명해 보입니다.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 가장 정직한 텍스트라는 것을, 그녀의 문학은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질문의 진화 - 폭력에서 사랑으로
한강의 문학은 하나의 거대한 탐구 여정과 같습니다. 하나의 소설이 끝나면, 그 소설이 남긴 질문을 품고 다음 소설로 나아갑니다. 『빛과 실』은 그 기나긴 항해의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여정에서 가장 빛나는 깨달음의 순간은, 작가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질문이 완전히 뒤집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질문을 거꾸로 뒤집어야 한다는 것을 “벼락처럼” 깨닫습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말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죽은 이들을 구원이 필요한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절망에 빠진 우리를 구원할 힘과 존엄을 지닌 존재로 바라보는 인식의 대전환입니다. 이 깨달음 덕분에 그녀의 문학은 죽음 속에서도 결코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리고 이 모든 질문의 가장 깊은 곳에는 결국 ‘사랑’이 있었다는 고백에 이르렀을 때, 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감상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잊지 않으려는 투쟁이고, 작별하지 않으려는 맹렬한 의지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깊은 사랑의 증거라는 것. 그녀의 문학은 결국 “얼마나 사랑해야 우리는 끝내 인간으로 남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책을 덮으며: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실타래
『빛과 실』은 강연문, 시, 사진 등 여러 조각들이 모여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조금 산만하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형식이 이 책의 내용과 완벽하게 닮아있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흩어진 기억과 통찰의 조각들을 한 땀 한 땀 실로 꿰어 하나의 무늬를 만들어내는 조각보처럼 말입니다.
이 작은 책은 한강이라는 작가가 얼마나 자신의 신념과 문학을 일치시키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입니다. 그녀의 글쓰기는 사라진 이들을 위해 언어와 기억의 실을 잣고, 그들의 고통과 존엄을 끝까지 붙들려는, 끝나지 않는 작별의 인사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정한 손길 덕분에,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잇는 ‘금실’이 존재한다는 희망을 얻게 됩니다.
'마음의 문장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로 배우는 내 삶을 바꾼 협상 기술과 실전 팁 (1) | 2025.07.22 |
|---|---|
| 불안과 상처, 어떻게 마주할까? 내 마음을 지키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2권에 담긴 심리학과 실천법 (1) | 2025.07.21 |
| 불안이 괴로운 날,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가 알려준 심리학 (0) | 2025.07.21 |
| 『세계 경제 지각 변동』 박종훈 : '성장 약탈'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냉철한 경고 (0) | 2025.07.19 |
| 『혼모노』 성해나 : '진짜'의 무게를 묻는 서늘하고 다정한 시선 (4) | 2025.07.18 |



